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룹 뉴진스.
SM의 컨셉디렉터가 준비했다고 하더니 과연이랄까... 어텐션은 곡도 잘 뽑혔지만, 컨셉이랑 안무가 거의 문화충격 급 아니었나 싶다. '4세대'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그룹들과는 세대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다르고 임팩트가 있었다는 반증일 테니까. 한류 자체의 글로벌급 인기몰이와 더불어 기존 컨셉에서의 극단을 찍은, 블랙핑크까지의 걸그룹들이 가진 작위적인 느낌과는 정반대의, '아이들은 아이들 스러울 때에 가장 빛나고 예쁘다' 는 명제를 정곡으로 꿰뚫은 느낌이다.
사실 본인은 K-Pop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구석이 있다. 사람으로서의 경험이나 성장 없이 기획사들의 상품으로 만들어져 청춘을 모두 바친 채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값지고 빛나는 것일테지만), 대중의 관심이 조금 시들해지거나 기획사에서 좀 아니다 싶으면 소리소문없이 해체하고 잊혀져 간다. 잠깐의 반짝이는 시간이라도 거머쥘 수 있으면 그나마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몇 년 간 세상을 씹어먹을듯한 기세로 나타났던 수많은 걸그룹들이 소멸하는 시간은 얼마나 빨랐던가?
https://v.daum.net/v/20230215162650201
주이, 모모랜드 해체 심경 "6명은 언제나 한 팀" [전문]
[스타뉴스 최혜진 기자] /사진=AAA 기자 star@걸 그룹 모모랜드가 해체한 가운데 멤버였던 주이가 이와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14일 주이는 "많이 속상했을 우리 메리(팬덤명)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v.daum.net
https://www.fmkorea.com/best/5497038215
걸그룹 해체 마지막 손편지 레전드
손편지 써서 올린게 전부 다 내용이 복붙임
www.fmkorea.com
최근에 해체 소식이 밝혀진 모모랜드 뿐이랴. 이들이나 크레용팝, 브레이브걸스, EXID 같은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기획사 출신 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사들 출신도, 보이밴드들도 마찬가지다. 앨범 수, 활동 연수는 얼마나 될까? 지금 보스급 포스를 보여주는 블랙핑크도 정규 앨범은 고작 두장 뿐이다. 물론 한번 공들인 컨텐츠로 최대한 확장해서 활동하고, 솔로활동과 미니앨범/싱글 위주로 소비되는 요즘 세상에 정규 앨범 수의 의미가 예전같지는 않겠지만서도. 얼마 전 '예체능계에서 재능이 꼭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지인들과 나누다가 문득 든 생각이지만, 역시 '대중 예술'이란 '순수 예술'과 반 쯤은 한 몸이면서도 반 쯤은 아주 다른 세상같은 느낌이다. 사실 「Rollin'」이나 「위아래」 같은 차트 역주행의 경우에도 보이듯, 그 안에서도 뜨냐 못 뜨냐는 어찌 보면 순전 운빨 아닐까 싶을 정도. 공급과 경쟁은 과잉 상태고, 단물 쪽 빨아먹고 버려버리는 인스턴트식 소비 사이클은 너무나 빠르다.
오디션 프로들 역시 이제 슬슬 그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던게 이미 몇년 전이다. 사실 한 번도 그렇게까지 오디션 프로들에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본 김창완의 지적을 보면서 아... 나도 이래서 어딘가 마뜩찮았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바가 있더라:
그냥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졸작들, 만들고 좌절하는 음악, 실망스러운 문학작품, 그림들… 그게 다 그 자체로 예쁜 거거든요. 그걸 되지도 않는 잣대로, 박수소리 하나만 갖고 잣대를 매겨서 누굴 상 주고 떨어뜨리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의 잔인한 속성을 부추겨서 장사를 해먹는 건 나는 반대입니다. 잘하는 애 칭찬하지 말라는 것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진짜 음악·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상품화하는 거니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되는 대로 엄마·아빠 얼굴 그려놓고 여기 초록색을 칠해도 될지 불안해하다가 칠하고 나서 좋아하고 이런 기억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점점 바보가 되는 건지, 사랑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자랄수록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바보 같은 어른들 때문에 청춘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난무하다 보니 이제는 개개인들이 다 오디션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이 다 오디션 중인 거죠. 이게 무슨 삶이고 인생입니까? 나한테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는데 다 쫓아냈어요. 이제 세상이 갈수록 교활한 오디션을 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고 삶의 참뜻을 생각하며 ‘유아독존’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김창완
이 인터뷰에서 곰곰히 되새기게 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곡을 만들 때 ~ 즉 예술•창작 활동을 할 때 ~ 의 근원적인 희열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히트할 거다, 이런 어리석음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음악 해보면 알지만 100곡을 듣는 것보다 한 곡을 만들 때의 희열이 있는데 이건 만드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희열이 있으니 직접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뉴진스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 그룹 참 신기방기하구나' 하다가 요새 출퇴근길에 다시 찾아 듣다보니, 머리 속에 떠오른 의문들도 이런 맥락의 것들이었다.
'그렇게 좋은가?' '오래 갈 수 있으려나?'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마 지금이 라디오 시대였다면 애초에 떴을지부터도 상당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이들의 음악 기조는 기본적으로 술에 물탄 듯 약간은 맹맹한, 혹은 남한식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구석이 있고, 그러면서도 몽환적이고 난해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앰비언스 음악 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컨셉이 가장 강점이지만, 동시에 이 컨셉의 핵심인 풋풋하고 싱그러운 시기는 인생에서 길어야 몇 년, 아주 구체적으로 잡으면 1~2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뉴진스의 멤버들은 ~컨셉 자체가 그런 방향인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역변을 할지 정변을 할지도 아직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 느낌이다. 어쩌면 국민 '여동생'처럼 고정된 이미지에 짜맞추기 보다는, 그 나이대와 그 순간에 맞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무위자연' 쪽으로 가면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
최근 이 그룹의 힘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 덕에 본 다른 이들의 커버들 덕분이다.
실력적으로도, 성숙함으로도 훨씬 완성된 권진아의 노래는, 단순히 곡 자체만으로 따지면 이 노래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뉴진스의 음악이 뭔가 찌르진 못하지만 계속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어지는 포인트가 있다. 뉴진스는 그 자체로서 청춘을 대변하지만, 그들의 곡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이 만든 어른들의 곡이라는 것을.
쇼츠로 먼저 접한 이지혜의 버전. 이제는 나이가 드러나는 살짝 쳐진 피부, 너무 또렷해서 어딘가 구식적인 창법, 그럼에도 참 맑고 깨끗한 목소리... 그 쇼츠의 댓글란에 달린, 문득 가슴을 파고드는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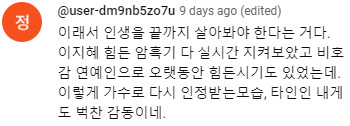
이지혜의 경우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다. 얼마전 흥행한 '슬램덩크'의 불꽃남자 정대만 같달까. 어려운 길이어도 자기가 보기에 정면인 방향으로 가는 걸 택하는 사람이구나 싶은... '살아낸다'는 말이 가진 느낌이 뭔지 보여주는, 보는 사람이 짠해지는 우직함과 억척스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퀴즈에서 눈에 띄어 찾아본, 한림예고 학생들의 Hype Boy 커버:
https://www.youtube.com/shorts/Lbirl9EgkDI

'청춘이다'라는 말 이외의 것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
체현화를 너무 잘한 것일까. 뉴진스의 음악과 퍼포먼스에는 단순히 동시대, 동년배의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힘 뿐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청춘을 향한 동경과 그리움까지 진하게 불러일으키는 향수 같은 것이 배여있다. Attention의 경우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Ditto나 Hype Boy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리움'의 코드가 곡에 담겨있고, 그룹의 음악적인 컨셉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동경과 몽환적인 느낌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혹은 연장되는 느낌이다. 민희진 산하의 뉴진스 팀은 발상의 시각 자체가 남다르다는 인상을 주는데, 대중음악 시장 자체가 기업화, 상품화된 대중가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부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좀 더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핑계로 직원들을 도구 다루듯 하기 십상인 업계에서도, 굳건한 토대 위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영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더더욱.




댓글